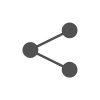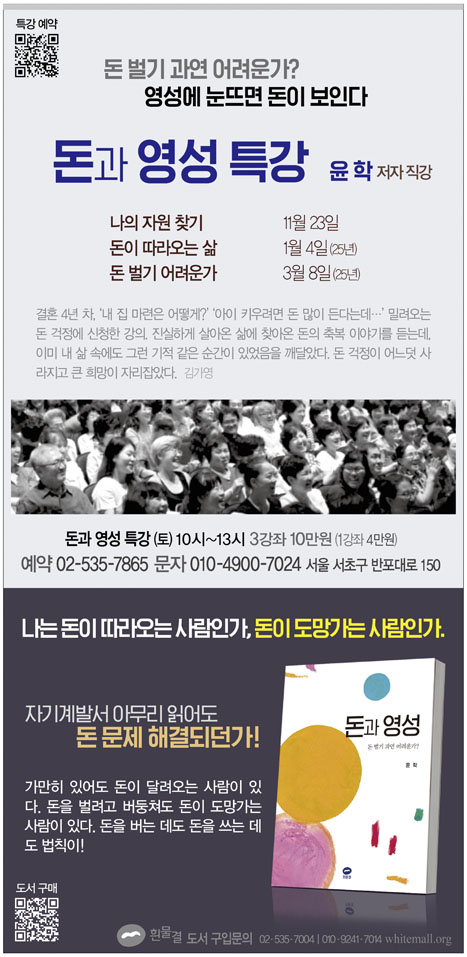윤혜원 기자
제주도로 2박 3일 출장이 잡혔다.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고 해 과감히 데려가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놀아줄 틈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 밤, 나와 남편은 제주도까지 왔는데 뭐라도 해줘야만 할 것 같았다. 비행기 타기 전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을 아이들을 재워놓고 폭풍 검색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을 선택했다. 해녀들과 화려한 수중 공연! 부모들도 강력 추천하고 있었다. 해녀 공연은 해녀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내려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해녀는 얼마나 깊게 잠수할 수 있느냐, 물 흐름의 방향을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고 했다. 막 물질을 배우거나 깊게 잠수 못 하는 해녀는 ‘똥군’이라고 부른다고 우스갯소리도 했다. 그 상군 해녀 할머니는 10대 소녀 시절부터 할머니를 따라 물질을 했단다.
보통 해녀들은 가족의 생계 때문에 해녀 일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군 해녀는 중군이나 하군 해녀들을 위해 얕은 바다의 해삼, 전복은 잡지 않고 남겨둔다고 했다. 물질을 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숨 쉬러 나오는 게 늦어져 죽는 경우도 있다며 해녀가 정말 가지면 안 되는 게 욕심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다. 설명을 들으며 어린시절부터 수십 년 바다와 함께 했을 해녀 할머니의 깊은 물 속 유영을 보고 있자니 뭉클해졌다.
해녀 공연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극찬한 수중 공연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나 그 기대는 곧 무너졌다. 커다란 스피커의 거센 음향, 전자음악 소리, 번잡스러운 조명에 정신이 없었다. 일곱 살 딸은 양 귀를 손으로 꼭꼭 막았다.
어째서 느낌이 다를까 모두 인간 한계 넘는 쇼인데 해녀 시연에는 해녀의 삶이, 수중 공연엔…
서커스는 상상도 못할 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이었다. 바이킹을 타고 공중 회전하면서 다이빙도 하고, 수십미터 꼭대기에 올라가 수직 낙하하기도 했다. 나는 공연자들이 다칠까봐 조마조마했다. 수중 공연을 보는 내내 배경음악이든, 조명이든, 공연 내용이 참 문화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위험천만해보이는 공연을 따라하고 싶다며 떼를 썼다. 아이들에게 좀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수중 공연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슬펐어. 해녀 시연은 뭔가 감동적이었는데…” 하는 것이었다. 해녀 시연도, 수중 공연도 둘 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쇼였다. 두 공연 모두 공연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느낌이 어째서 다를까 참 궁금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월간지를 출판하는 부모님의 인터뷰에 따라갈 기회가 많았다. 한번은 주교님 인터뷰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갔다. 나와 내 동생 둘은 인터뷰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을 때였다. 부모님은 인터뷰가 끝나면 꼭 수영하러 가자며 옷 안에 수영복까지 미리 입히셨다. 그런데 인터뷰가 어찌나 길어지던지… 결국 우리는 수영복만 안에 입은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묘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어른들의 3시간도 넘는 대화를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주교님께 궁금한 것을 나중에 질문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많이 따라다녔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꺼내놓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 담긴 가치도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무얼 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것을 고민하며 소년 소녀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 들려주는 얘기마다 어찌나 재밌고 유익한지 어린 나도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도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아빠가 아무리 내용을 끌어내려고 해도 자신의 삶에 얘기가 없는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진부한 말만 늘어놓아 나까지 안타까웠다. 그런 일이 거듭될수록 ‘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삶을 탄탄하게 살아야겠구나’ 싶었다.
인터뷰 어찌나 길던지… 지루하게 기다리는데 아빠가 질문 해보라고 하자 대화 들리기 시작
인터뷰 허락받기도 어려운 분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매번 어린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빠 엄마는 그런 자리에 왜 우리를 데려갔을까? 우리가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두 공연의 느낌이 달랐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삶’이 바탕이 된 공연과 그렇지 않은 공연의 차이였다.
해녀 시연에는 해녀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런데 수중 공연에는 그 공연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없었다.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장치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아, 이런 게 공허한 것이구나! 나도 내 아이들이 순간의 흥미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귀 기울이며 그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해녀 할머니들이 해녀 소녀들에게 가치를 전수해 준 것처럼, 아빠 엄마가 나에게 귀한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한 것처럼… 한여름에 수영복 껴입고 속으로 ‘엄마 아빠는 맨날 약속도 안 지킨다’며 부글부글했던 그 시간이 지금은 내게 참 소중하게 다가온다.
윤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