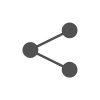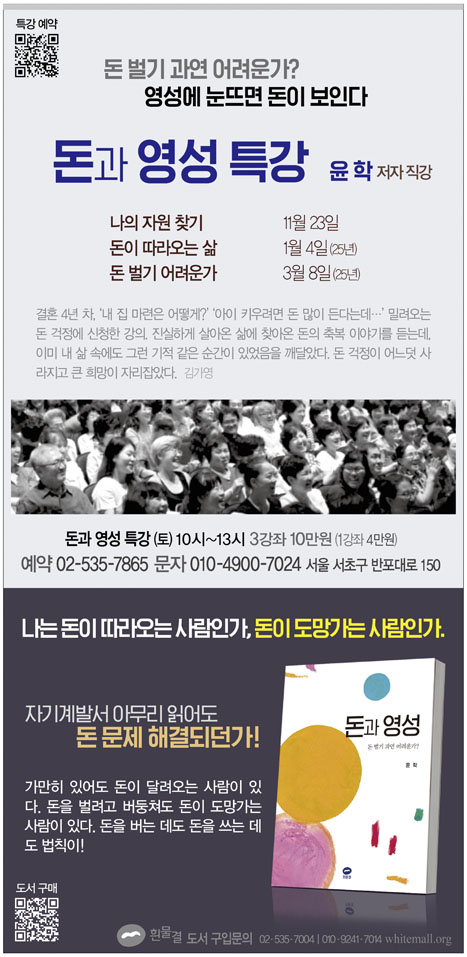윤혜원 기자
“이 많은 집 중에 우리 두 사람 들어갈 집이 없다니…” 신혼집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집값 비싸다’는 현실의 벽을 피부로 느꼈다.
집이 좀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가진 돈으론 꿈도 꿀 수 없었다. 하루는 부동산 광고에 올라온 내부 사진과 가격이 괜찮다 싶어 갔는데 반지하였다. 그렇지만 내부가 너무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돼서 계약할 뻔했다.
월셋집이었던 신혼집 들른 외할머니 “식탁을 모시고 사네” 하지만 부모님은 월셋집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다음날 다시 보니 빛도 안 들고, 창문을 여니 사람들이 지나갈 때 흙먼지가 들어왔다. 여러 집을 보다 보니 가격들이 그 집 가치에 맞게 어찌나 정확히 매겨져 있는지 신기했다. 그렇게 발품 팔아 겨우 구한 첫 신혼집은 작지만 깨끗한 월셋집이었다.
첫 집들이 날, 친구들은 내색 안 하려 했지만 ‘쟤가 결혼을 잘못했나?’ 하는 눈치였다. 학창 시절 우리 집은 꽤 넓고 좋은 집이어서 친구들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다. 그런 내가 친구들의 신혼집보다도 훨씬 초라해 보이는 집에서 사니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이었다. 우리가 사는 걸 보러 오신 외할머니도 “식탁을 모시고 사네~ 뭐가 이렇게 좁다니~” 가실 때까지 좁다는 얘기만 계속하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하자마자 부모 도움 없이 척척 집 살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 너희 가진 돈으로 월셋집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거야. 부모들이 척척 집 사주고 자식한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이들 망치는 거다. 월셋집에서 전셋집으로, 전셋집에서 자기 집으로, 조금씩 평수 늘려가는 그 재미는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는 기쁨인데 부모가 뺏으면 절대 안 돼!”
나도 남편과 함께라면 평생 이 월셋집에서 살아도 좋겠다는 행복감을 느꼈다. 밤이면 우리는 소파도 없는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함께 덮어쓰고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다.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 축구 규칙을 하나도 모르는 나였지만 축구 광팬인 남편을 따라 새벽에 월드컵 생중계를 보며 열띤 응원도 처음으로 해봤다. 미국에서 휴가차 오신 시부모님과 두어 달 함께 살았는데 출근 준비하라며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언제든지 배려해 주셨다.
하루는 아버님이 “너 배 아플 때 먹는 한약을 좀 먹었다” 하시는데 그 약은 소화제가 아닌 변비약이었다. “가뜩이나 배가 아픈데 변비약을 드시다니…”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러게~ 며느리가 전에 효과 좋은 약이라 했다며 엄청 드시더니 종일 설사로 고생했어” 하며 깔깔 웃으셨다. 핼쑥해진 아버지도 허허 웃으셨는데 그날의 풍경이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위층에 사시던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녀들이 밤에도 어찌나 싸우는지… 상속 문제가 정리가 안 된 듯했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며, 월세는 누구한테 내야 하는가 고민이 됐다. 또 자녀들마다 신경이 곤두선 채로 집주인 행세를 하니 마치 여러 시어머니를 모시는 기분이 들었다. 나와 남편은 ‘아~ 이런 게 집 없는 설움이구나’ 하며 우리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런 데다 나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 A가 부모님 도움으로 반포에 지은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 또 한 친구 B는 부모님이 서초동 재건축 단지에 집을 사줬다는 것이었다. A는 프리랜서로 드문드문 일을 했고, B도 부모님이 차려주신 카페를 운영하다 얼마 전 문을 닫았었는데…
문득 나는 내가 먼저 결혼도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지는구나 싶어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