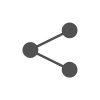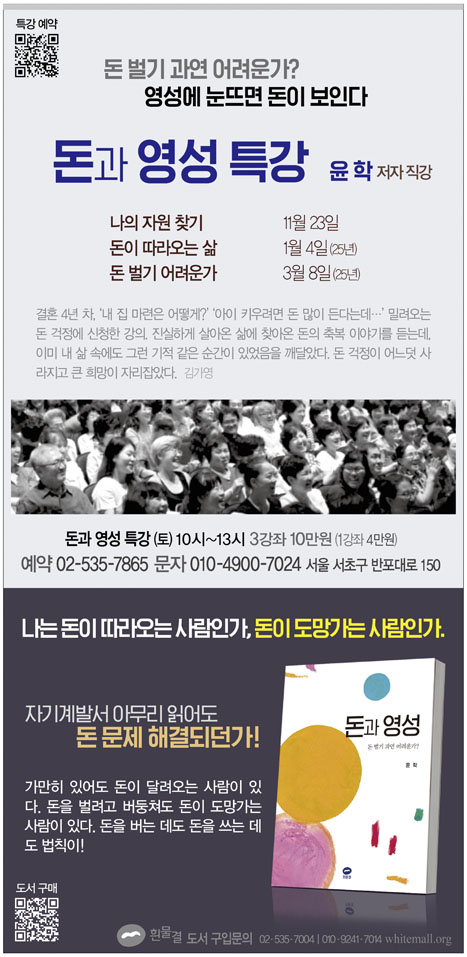윤혜원 기자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발견한 자전거.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줬던 자전거와 똑같겠거니 하고 자신 있게 탔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내가 타던 자전거는 보조 바퀴가 달린 네발자전거, 친구 것은 두발자전거였다.
그날, 친구들이 두발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부럽던지… 그치만 겁이 꽤 많은 나는 그 뒤로도 두발자전거를 타보지 않았다.
스물셋, 미국 유학 시절, 성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인사만 잠깐 나눠본 그가 밥 먹자고 했다. 나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좀 어려워해, 그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나갈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뭔가 편안하게 대화를 이끄는 그가 궁금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자그마한 동네 음식점. 분위기가 따뜻한 데다 맛까지 있었다. 값도 비싸지 않으니 어찌나 좋던지… 학생 신분인데도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 코스로 요리를 시키며 뭔가 과시하려 하는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다.
남자친구가 대뜸 자전거 두 대를 빌렸다. “나는 자전거 못 타는데…” 어느새 나도 그와 나란히 자전거로 씽씽 달리고 있었다. 새파란 하늘 아래…
그렇게 그는 남자친구가 되었다. 여름날, 그가 소풍을 가자고 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진수를 맛봐야 한다며 대뜸 자전거 두 대를 빌렸다. “나는 자전거 못 타는데… 어떡하지?”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와 함께라면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뭐 하나 가르쳐주더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 내 걱정을 싹 날려주었다. 긴장을 하지 않으니 두발자전거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느새 나도 그와 나란히 자전거로 씽씽 달리고 있었다. 새파란 하늘 아래 센트럴파크의 푸른 잔디와 나무들이 시시각각 펼쳐졌다. 다리를 건널 때 언뜻언뜻 보이는 호수, 호수에 반짝이는 햇살,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풍경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장관이었다.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한참을 달리다 벤치에 앉아 함께 나눠 먹던 도시락은 우리를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어느덧 그와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로스쿨 생활로 긴장의 연속이었던 나를 그가 춘천으로 데려갔다. 춘천역에 내리자마자 그는 자전거 두 대를 빌렸다. 그는 춘천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나를 안내했고 내 마음은 어느새 말랑말랑해져 있었다. 그런데 너무 신나게 놀았던 걸까? 씽씽 달리다 보니 춘천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있었고 시간은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있었다. 우리는 기차를 놓칠까 봐 서둘러야 했다. 택시도 잡히질 않았다. 버스도 세워 물어봤지만 자전거를 가지고는 탈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기차 시간 내에 빨리 자전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비 오는 날의 데이트 61×76.2cm Oil on Canvas
할아버지는 자전거 잘 못 타는 할머니를 뒷자리에 태우고
할머니는 행여나 할아버지가 비 맞을세라 팔을 쭉 뻗어 우산을 씌워주고…
자전거 도로도 아닌 도보를, 그것도 깜깜한 밤에 달리는 게 무서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