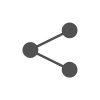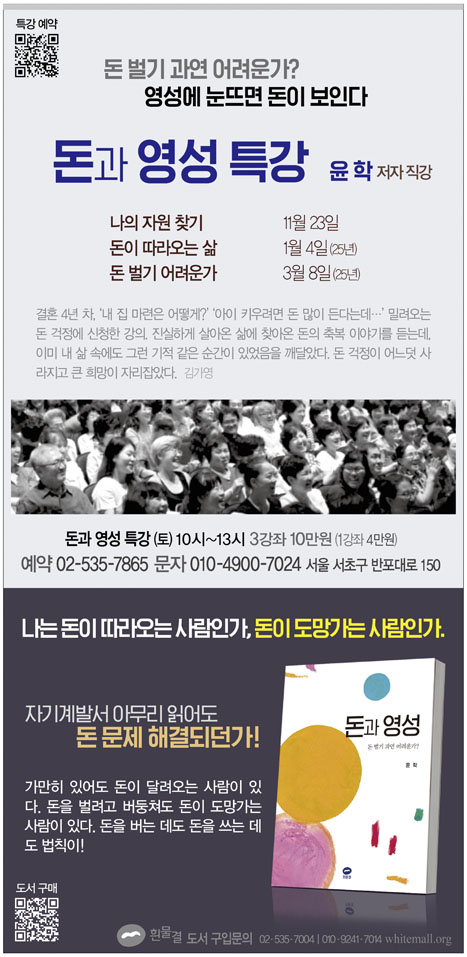가족에게 투명인간이 된 중역
한혜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세 시대
지난 10여 년에 걸쳐 1000여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는 ‘후회’였다.
은퇴자들이 들려주었던, 고통스럽고 슬펐던 진실을 그냥 이대로 묻어둘 수 없어 연재한다.
몇 달 전 58세에 은퇴했다는 B씨는 대뜸 자신을 두고 ‘엄청 후회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객관적인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했다.
B씨는 지난 몇십 년간 잘 나가는 은행원과 펀드매니저로 일했고, 그의 아내 또한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여 현재까지도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이들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웬 후회? 이제 시간 있고 돈 있으니 재미있게 사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싸움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B씨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돈 잘 벌었으니까 행복한 줄로만 알아 근데 점점… 부부 사이에 할 말이 없어져 마치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져
내가 다시 물었다. “두 분 사이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싸움도 하지 않을 만큼 서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뜻이죠. 싸우는 걸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불만이 머리끝까지 쌓이다가도 월급날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면 모든 불만이 사라지고, 모든 게 용서되고. 갑자기 동료의식이랄까, 아니면 공범의식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런 비슷한 감정도 생기고 그랬죠”
B씨의 말은 이어졌다. “애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으니까요. 서로 바쁘니까 양가 어른들 도움도 받고 남의 도움도 받으면서 키웠는데 아무튼 애들 양육하는 데는 서로 손발이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비싸다는 사교육비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잘 벌었으니까 행복한 줄만 알았죠. 그런데 점점…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B씨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슨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B씨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애들을 모두 유학 보내고 나서, 어느 날 집사람이 말하더군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서로 자유롭게 살자. 당신도 바람 같은 거 피고 싶으면 실컷 피워라. 단 조건이 있다. 돈은 한 푼도 잃지 않도록 하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집사람한테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일찍 유학을 보냈던 거고…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니까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뿐이죠” B씨는 계속했다. “그래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일에 파묻혀 살면서 잊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힘드네요”
“네, 그런데 은퇴 후에 부부 사이가 더 나빠졌다든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집사람은 아직 회사에 다니니까 새벽에 나가서 오밤중에 들어와요.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밥 같은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잠시 후 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B씨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B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어떤 때는 집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내가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밖에 안 되냐?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 다 내놔라’ 소리치고 싶어요”
B씨는 한참 만에 덧붙였다. “하지만, 저도 잘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도 벌지 못하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가족들이 자신을 ‘돈 버는 기계’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은퇴자를 많이 만났다. 특히 남편의 속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녀에게만 신경 쓰면서 ‘돈 벌어 오라’고 들들 볶는 아내들에 대해 분노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우리는 종종 은퇴한 남편의 분노가 ‘아내 살해’ 등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은퇴 후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던 차에 아내마저 돈 못 벌어온다고 다그치자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 말이다.
하지만 남자들이 피해자이기만 할까?
한혜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보건사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