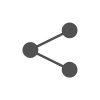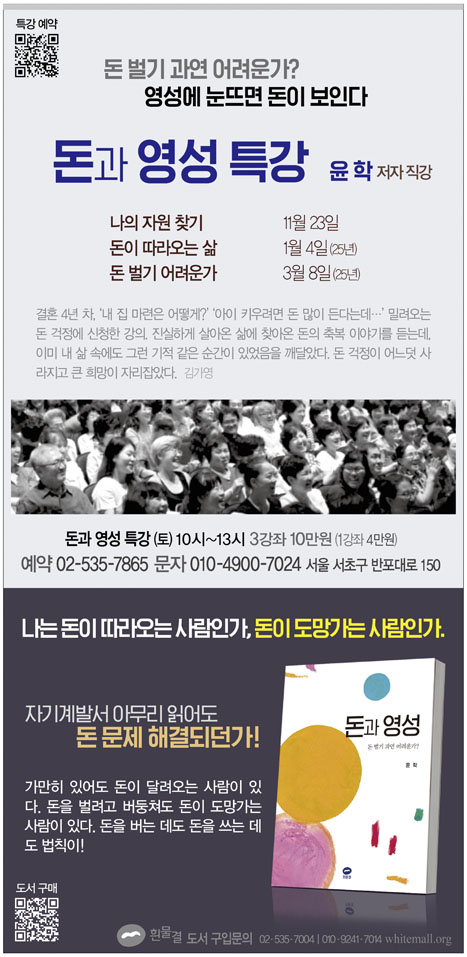누가 투기세력 불러들였나
윤기향 경제학과 교수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소라 <바람이 분다>
풍요의 90년대가 무르익어가던 무렵인 97년 7월, 갑자기 태국 바트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다음 날인 1997년 7월 2일이었다.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아시아의 외환위기에 불씨가 뿌려졌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투기꾼들은 바트화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바트화를 계속 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의 공격은 그해 10월에는 한국의 원화로, 필리핀의 페소화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로 번지기 시작했다.
탐스러운 과실 보며 그간 땀 흘려 이룬 富 과시 분위기에 젖어
아시아 외환위기의 유탄을 맞은 나라들의 경제는 처참함 그 자체였다. 통화가치(1달러당 환율)의 변동을 보면 한국 원화가 850원에서 1,290원으로 34.1%, 태국 바트화가 24.5바트에서 41바트로 40.2%,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2,380루피아에서 14,150루피아로 83.2% 각각 하락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도성장의 과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고 그동안 땀 흘려 축적한 부를 과시하려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게 열매를 맺었지만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양은 메말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특히 한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성장의 동력이 꺾이는 변곡점에 들어갔다. 한국은 세계화다, 개방화다 해서 그동안 외국시장에 빗장을 걸어놓았던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외국 상품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외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들 또한 외국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과잉소비, 과잉투자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과잉소비, 과잉투자는 필연적으로 과잉차입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 투자를 위해서는 외환, 특히 달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한국의 외환 곳간은 급격하게 비어갔다. 과잉소비, 과잉투자가 가져온 결과였다.
그 당시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한 나라의 외화보유액이 바닥에 이르면 투기 세 력들은 그 나라가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방어할 수 없음을 간파하게 된다.
외환위기 바람 몰아쳐. 실직자들 거리 메워. 그 쓸쓸한 풍경은
국제 투기 세력들이 볼 때 이는 좋은 먹잇감이다. 외환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아픔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길거리에 휘몰아쳤으며 실직자들이 거리를 메웠다. 위기의 그림자는 마치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처럼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집어삼켜 갔다. 그 쓸쓸한 풍경은 이소라가 2004년에 발표한 곡 <바람이 분다>의 가사를 떠올리게 한다.
97년 외환위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위기의 충격파가 급속도로 다른 나라로 전이된 점이다. 이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로 알려진 현상이다. 태국에서 일어난 위기가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와 브라질까지 전이되었다.
한국은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95억 달러, 국제개발부흥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가까스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
그 결과 외환위기는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IMF가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날이 성탄절이었다. 외신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성탄절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윤기향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