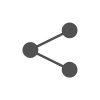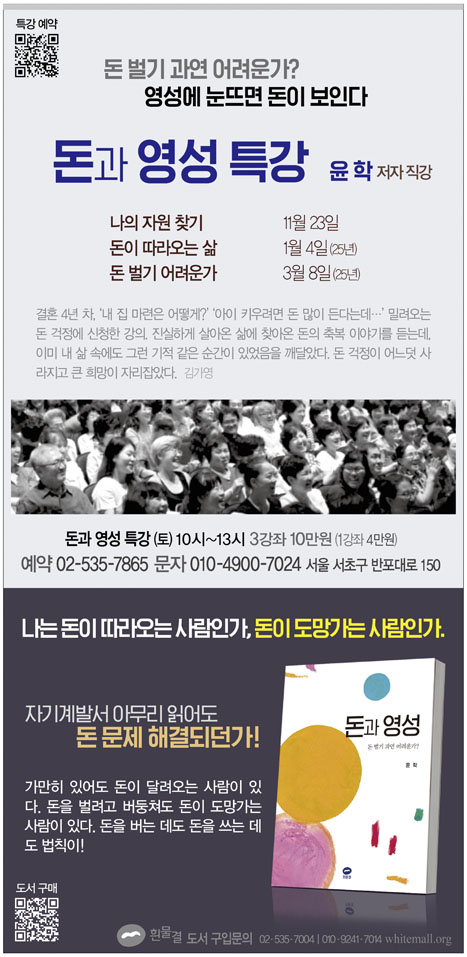나의 예술 이야기
조숙의 조각가
1977년 봄, 미대 4학년 때 남자 중학교 1학년 반으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교실을 가득 메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초롱초롱 풋풋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여러해살이풀 초롱꽃처럼. 나를 반기며 인사하는 학생들이 낯익은 듯이 반가웠다. 내 어깨 밑을 쏜살같이 스쳐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역동적 에너지가 넘쳤다.
1학년 학생들이라 중학교 3년 내내 입을 수 있도록 교복을 크게 맞춰 입었기 때문에 옷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더욱 작아 보였다. 머리는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밀려 있었다. 일률적으로 단장한 외모의 학생들이 교실을 빼곡하게 메우고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을 마주 보았다. 전체 학생들이 이렇듯 하나같이 통일된 복장으로 있는데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다.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얼굴들… 특별히 눈빛이 더 다른 듯했다. 다채로운 모습이 오묘하고 예뻐서 나로 하여금 저절로 함박미소를 짓게 했다.
첫 교생 실습 때 교실 가득 메운 학생 한 명 한 명 구분할 수 있어 다채로운 얼굴이 오묘해서…
수업이 끝나면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우렁차게 한목소리로 외쳤다. “열중 쉬엇!”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함성과 함께 벌집을 건드려 놓은 듯 사방으로 신나게 튀어 올라 흩어졌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이 아이들처럼 평생을 즐겁게 놀이하듯 살아간다면 더없이 행복한 삶이 되리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손바닥만 한 작은 얼굴에 눈, 코, 입 위치가 모두 같건만 각각 다른 무수히 많은 얼굴이 나올 수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교단에 선 첫날의 경험 덕분에 아무리 서로 같은 옷을 입혀 놓아도 사람의 얼굴은 개별적이고 특별해서 유일무이하다는 점이 강하게 새겨졌다. 인간의 ‘얼굴’은 무한히 신비롭게 열려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의 얼굴이 개별적으로 정교하게 창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간이 그만큼 각자 존엄한 존재라는 뜻일 것이다.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안면 근육이 담아내는 인간의 다양한 미소는 놀라울 정도로 신비롭다. 그 숱하게 피어나는 미소의 깊이는 우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깊이 역시 헤아릴 길이 없다.

얼굴의 아주 작은 부위 하나라도 얼마나 신비한가. 절묘하게 자리 잡은 얼굴 양 측면의 ‘귀’는 그 위치나 기능만큼이나 신비롭기만 하다. 우리가 안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러나 귀의 기능은 단순히 안경걸이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채 생명을 지키려 했다. 창조주는 첫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필요를 잊지 않았던 것일까. 귀는 그 위치와 생김새가 귀엽고 얼굴을 빛나게 장식하고 있다. 멋 내기에도 적당해서 남녀 누구나 일상의 삶을 지루하지 않도록 소소한 변화와 재미를 생산해낸다.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여기, 안경 너머로 이 글을 쓰도록 소리 없이 인간의 문명을 보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해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