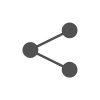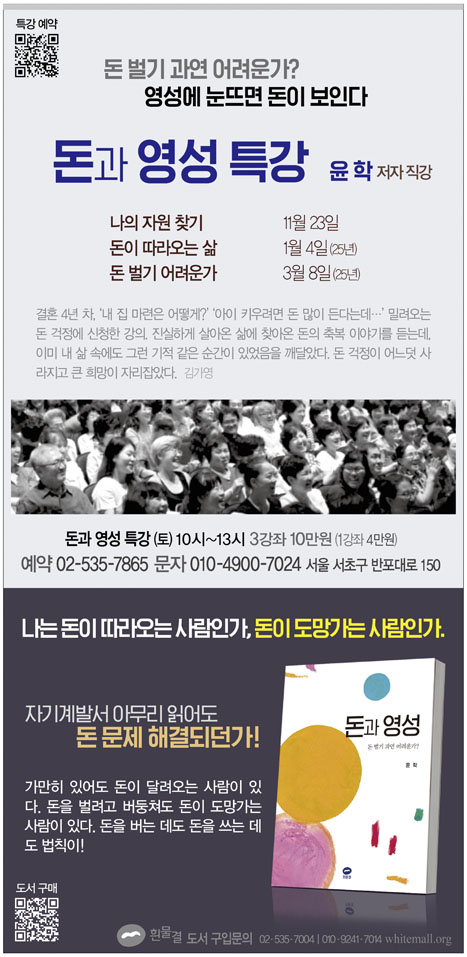류해욱 신부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중략)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박용재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현대인들은 경쟁 속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우리가 천천히 머무르는 시간을 잃어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시 읽기를 권하고 싶다. 시를 읽는 것은 머무는 것이며 기도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시편으로 기도했다. 시편은 시로 하느님께 고백한 신앙의 언어였다. 우리의 신앙이 시편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편뿐 아니라 많은 시가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승화시켜 준다. 좀 더 많은 이들이 시를 읽고 그 안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삶을 한 편의 시로 읊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종종 ‘사람’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면서 오타를 내곤 한다. ‘람’자에서 실수로 모음 ‘ㅏ’가 빠지는 바람에 ‘삶’이라는 글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 문득, 재미있는 깨달음이 있었다. ‘사람은 삶이구나’ 라는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발견한 것이다.
삶은 무엇일까? 삶은 사랑 사람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진정 살아있는 삶은 아닐 테니까
사람이 삶이라면, 삶은 무엇일까? 박용재 시인의 시에 의하면, 삶은 사랑이다. 사랑한 만큼 사는 게 삶이니, 삶은 사랑인 것이다. 사람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진정 살아있는 삶은 아닐 테니까. 결국 사람은 나이나 부귀영화로써가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능력으로써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서로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일까? 에밀리 디킨슨의 ‘사랑이란 도처에 널려있는 것’이라는 시가 있다.
사랑이란 여기저기 널려있다네.
우리는 모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지.
사랑은 충분히 있다네.
하지만 사랑을 가져다가
우리 몫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삶의 방식에 달려있다네.
에밀리 디킨스 사랑이란 도처에 널려 있는 것
우리는 사랑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가 바로 문정희 시인의 ‘순간’이다.
찰랑이는 햇살처럼
사랑은
늘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못했다.
쳐다보면 숨이 막히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처럼
그렇게 눈부시게 보내버리고
그리고
오래오래 그리워했다.
문정희 순간
찰랑이는 햇살처럼 사랑은 늘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못했다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겠지만 곁에 있던 사랑을 떠나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도처에 널려있는 사랑스런 존재들을 발견하고 그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삶, 더 높은 삶으로 비상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날개’가 달리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제가 지니고 있는 것은
그대가 외로울 때
그대의 손을 잡아 줄
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가 슬플 때
그대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를 빛나게 할
작은 미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가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그대를 안아줄
가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를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자미상 제가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숙제는 다만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몫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은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류해욱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