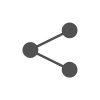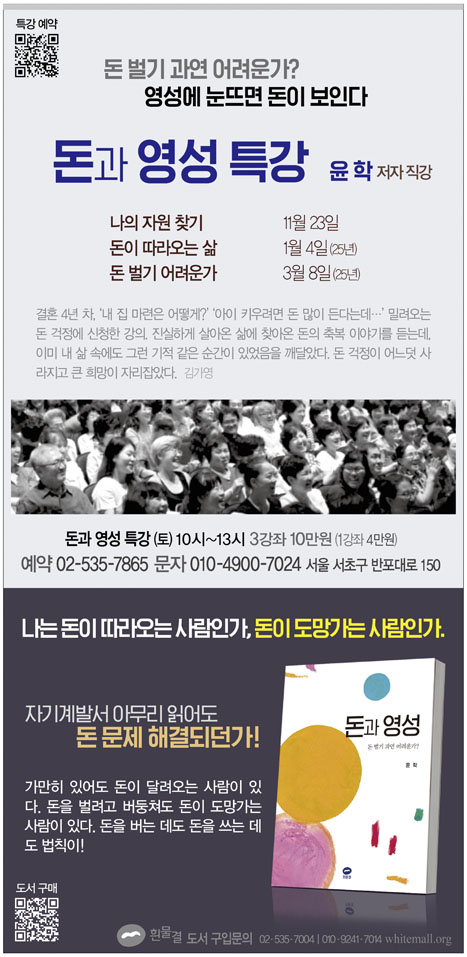발행인 윤학
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추진한 교사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그 교사가 교장의 뜻에만 맞춰 무리하게 일을 처리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날마다 고성을 지르며 농성을 이어갔다.
교장의 처신도 문제지만 교장 문책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학생 지도며 수업 진행, 학교 운영은 교장의 문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교사의 최우선 의무는 아예 제쳐둔 채 교장 문책에만 몰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사회 곳곳에서 이런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장 ‘자리’보다 교사의 역할이 훨씬 귀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교장 문책에만 힘을 쏟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리’를 그 본래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도 내 삶도 바뀐다는 생각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여러 번 바꾸었는데 내 삶이 달라지던가.
실제로 5의 힘만 갖고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100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대통령도 100의 힘을 갖고 있는 줄 착각하고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권력에 취한 대통령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정권교체만 향해 질주하고 여당은 그걸 막아내는데 몰두한다. 결국 국민들도 편을 갈라 진흙탕 싸움에 빠져든다. 지금도 온 국민이 본래 5의 힘밖에 없는 대통령 ‘자리’ 하나에 몰입하고 있으니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며 문화며 국력은 어찌 되어가겠는가.
요즘 언론은 신이 났다. 대통령을 맘껏 두드려 패면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기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근원”이라는 정답으로 가득 차 있다.
실제 5의 힘만 가진 대통령을 국민들은 100을 갖고 있다고 믿어 대통령이 권력 남용
「대통령의 남은 3년 어디로?」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윤 대통령을 주목한다」 어릴 때부터 선거 후 수없이 읽어왔던 똑같은 기사들을 오늘도 숨을 죽이며 봐야 한다.
이번 선거는 분명 국회의원 선거였다. 그런데 그 선거의 승패에 너도나도 대통령 자리를 들먹이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다. 우리는 배가 뒤집혀도, 화재가 나도, 수출이 부진해도, 생활이 어려워도, 북한에서 총 한 방 쏴도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인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은 없다.
국가적 과제는 제쳐두고 대통령 문책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통령 지위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믿는 것이고 반면에 그 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문책하냐 마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대통령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가 잘 살고 대통령이 못하면 우리가 못산다고 말한다. 이것은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런 착각보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잘된 일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