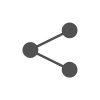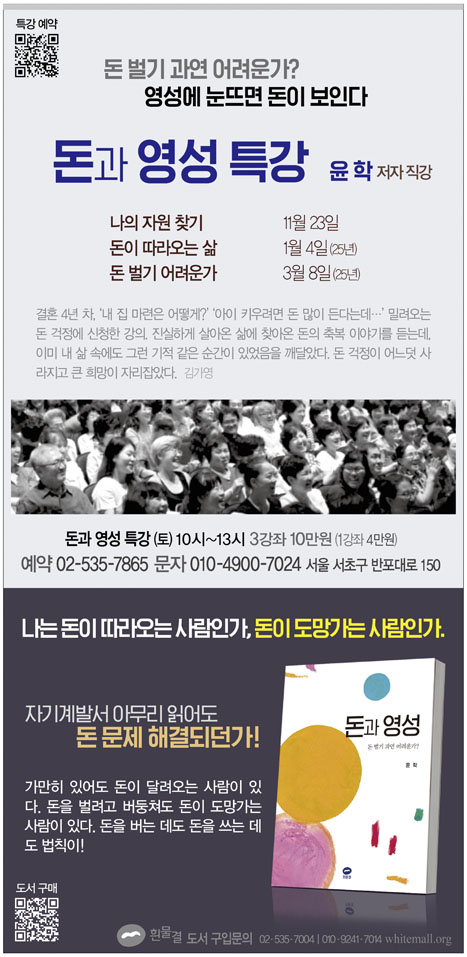이경주
며칠 전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경주니? 이제 아기 보러 와도 되니까 올래?” 안 그래도 아기를 낳았다고 하여 궁금하던 차였다.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언니 집으로 향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는데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다. 그러자 언니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아기를 안고 어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는 언니와 편안히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추억이 떠올랐다.
나른한 오후 과학시간 선생님께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금부터 3분간 창밖을 본다. 실시~!”
7월쯤이었다. 나른한 오후 과학시간, 잠이 모자란 것은 물론이고 점심까지 먹은 뒤라 졸음이 쏟아졌다. 아이들과 나는 반쯤 감기는 눈꺼풀을 힘겹게 뜨며 간신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활기차게 들어오신 과학 선생님께선 “자,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다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졸려 죽겠지?” “예, 졸려요” “너희들 요즘 하늘 본 적 없지? 자, 지금부터 3분간 창밖을 본다. 실시~!”
아이들과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수런거렸다. “갑자기 선생님 왜 저러시지? 너 과학 선생님 좋아하잖아. 오늘 뭐 달라 보이는 거 있어?” “아니, 없는데” “야, 그래두 수업 안 하니까 좋다. 하라는 대로 하자” 수런대며 웃음 반 졸음 반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실로 오랜만에 바라본 하늘은 예전에 봤던 푸른빛 그대로였다. 시간이 흐르자 선생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모두 책상에 엎드린다”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말씀에 책상에 엎드린 아이들도 있었고 아랑곳 않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겠다고 과학 문제집에 코를 박고 씨름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자자, 거기 엎드리지 않은 녀석! 지금 그거 한 문제 덜 푼다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엎드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엎드려야 한다. 자, 엎드렸으면 눈을 감는다. 실시~!” 우리는 책상에 이마를 박고 엎드렸다.
잠시 뒤 선생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