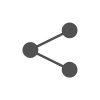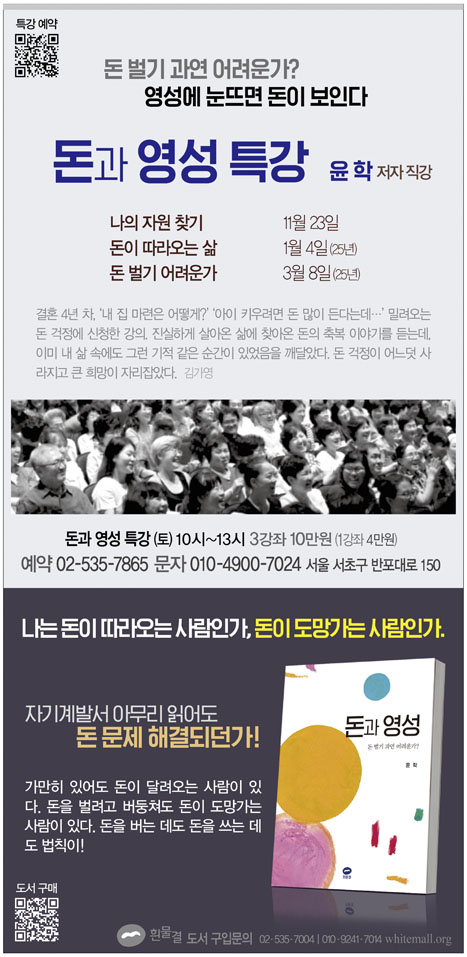발행인 윤학

“글 쓰는 사람은 못 산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다.
책에서 나는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옳다고 믿는 바를 외롭게 묵묵히 해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재미에 빠지면 나는 책을 놓지 못했다.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든 채 읽으면서 학교에 갔다. 바람과 하늘과 햇살로 가득한 바닷가 제방 위를 걸으며 나는 수없이 선한 사람들을 만났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 곁에는 책이 있었다. 친구들은 끼리끼리 장난치며 신작로를 따라가지만 나는 제방길로 들어서곤 했다. 책을 읽으면 선생님도, 아버지도 심어주지 않은 불씨가 내 가슴을 타오르게 했다. 친구들과 아무리 신나게 뛰어놀아도 맛볼 수 없던 환희였다.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면! 나도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글은 마음대로 써지지 않았다. 글 쓰는 사람은 못 산다는 어른들의 말도 마음에 걸렸다.
막막하던 그때 글이 길을 알려 줘
책에서 맛보았던 그런 통쾌함 내 삶에서 실제 맛보고 싶어
변호사가 된 후 나는 어릴 적 읽었던 글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어도 정당한 대가 이상 돈을 받지 않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도와야 할 사람은 돕는 사람이 되어보려 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일 전관예우니 유전무죄니 소리높이 외쳐댔다. “판검사도 안 한 너에게 손님이 있겠냐? 브로커라도 써야 한다더라” 아버지도 걱정을 하셨다. 그럴 때면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인가 의구심도 생겼다. 어릴 때 어른들이 ‘글 쓰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변호사는 돈을 잘 번다’고 하더니 그 말도 틀렸단 말인가.
막막하던 그때, 어릴 적 염전길을 걸으며 읽었던 글들이 길을 알려주었다. 모두가 그르다고 해도 옳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가. 그런 글을 읽으며 얼마나 통쾌했던가. 그런 통쾌함을 실제로 맛보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글에서보다 굉장할 것이 분명했다. 책에서 읽었던 대로 손님을 대하고 손님에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변론을 준비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을 소개해 주고 또 다른 손님을 소개해 줘 내 사무실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릴 적 읽었던 글이 내게 손님도, 돈도 가져다주었다.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말만 따르다가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글에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받은 빚을 갚기로 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기로!
하지만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왔다. 그래도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좋은 글을 읽으면 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글을 쓰자 내 삶을 통해 나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나와는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만나야만 세상 만물도 의미 있게 다가와 진정한 삶이 시작되지 않는가.
어릴 적 글이 내게 돈도 가져다 줘
글에 빚 진 나는 그 빚을 갚기로. 사람들도 글을 쓰게 하자!
글을 쓰자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다가왔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만 글을 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도 글을 쓰게 하자! <에세이스쿨>을 열었다. 일본에서도 <도쿄 에세이스쿨>을 시작했다. 하루는 아주 어두운 얼굴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젊은 시절 일본에 건너와 힘겹게 살아온 얼굴이었다. 나는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삶을 빛나게 하는지 온 힘을 다해 강의했다. 그녀가 좋은 글을 써내기를 바라며…
다행히도 그녀의 글에는 순수한 인간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글을 책에 실었다. 그다음 <도쿄 에세이스쿨>에 나온 그녀의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 딸내미가 수다나 떠는 엄마인 줄 알다가 책에 실린 내 글을 읽더니 ‘엄마는 역시 다르다’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죽을 때도 내가 막 웃으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번 생은 너무 억울해서 ‘윤회라는 게 꼭 있어서 다음 생은 잘 살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난 윤회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글이 생명을 생명답게 온전히 살려낸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다.
요즘 신문에는 남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거나 얻어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처럼 엮은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생소한 외국 사람 이름을 들먹이며 많이 아는 척,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려고도 한다. 사건사고나 타인의 삶을 틀에 박힌 이론에 꿰맞춘 글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삶을 충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부터 쓰고 싶을 것이다. 내 삶을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내 삶을 써 나가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내 삶도 신나게 채워나가려 한다.
남의 삶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내 삶’이 있는 사람은 ‘내 이야기’부터 안 쓰고는 못 배겨
낮은 가치는 높은 가치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돈도 자신보다 더 가치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을 따라가려 하지 않겠는가. 자신에게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을 하며 자신을 돋보이려는 데만 힘을 기울이는 사람은 돈도 멀리하려 할 것이다. ‘글 쓰는 사람은 못 산다’는 말이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구체적인 삶은 없이 추상적인 이론으로 얼버무린 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는 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글만 쓰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 전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자신도 글을 쓰고 싶다며 <에세이스쿨>에 왔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좋다는 자리는 차지해 보았지만 ‘내 이야기’가 있는 ‘내 삶’을 살지 못했다며 글이 써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내 삶’이 있는 사람, ‘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늘어가기를 소망한다.
발행인 윤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