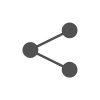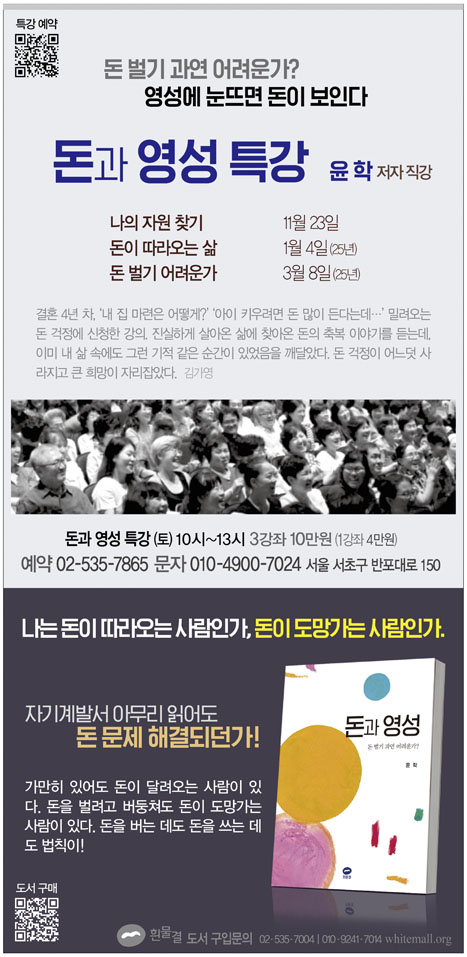요리책 베스트셀러 저자의 진실
장선용 요리연구가
장선용의 요리책 하면 다들 요리책의 정석으로 생각해요. 최근 ‘윤식당’에서 배우 윤여정 뭇국 레시피의 출처로 꼽혀 다시 화제를 모았더라고요. 몇십 년간 30만 부 이상 사랑받는 비결이 궁금해요
식구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욕심에 요리 배우고 연습했더니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음식 가르쳐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레시피 달라는 사람도 생겼어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요리연구가’가 되어 있더라고요.(웃음)
처음부터 요리연구가가 될 욕심으로 요리에 뛰어들었더라면 이날까지 요리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로 여기며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며느리 매번 국제전화로 요리법 물어와 오죽 답답하면 시어머니한테 이리 전화를
요리책을 내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민을 갔는데 매번 국제전화로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파 한 단도 안 다듬어 보던 며느리가 오죽 답답하면 시어머니한테 이리 전화를 많이 할까 싶더라고요.(웃음) 그래서 며느리에게 주기 위해서 조리법을 한 장, 한 장 틈날 때마다 손으로 써 내려갔죠. 정확한 계량과 조리 시간을 적어 며느리가 전화로 따로 묻지 않고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며느리에게 보낸 ‘조리법 편지’가 차곡차곡 쌓인 거죠. 행여 며느리들 살림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될까 봐 ‘너희들 입맛대로 하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어요.(웃음) 그런데 매번 “가르쳐주신 대로 했더니 진짜 맛있어요” 해줬고 며느리가 그 편지들을 잘 간직해놨더라고요. 며느리 주변 사람들이 그 조리법 편지를 복사해 나눠보면서 자기들끼리 ‘매일 해 먹는 요리책’이라는 제목까지 붙였대요. 결국 며느리의 제안으로 조리법 편지들을 엮어 책으로 내게 된 거예요.
이 책엔 화려한 요리 사진은 없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 완성된다는 독자들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요리책 중에 그대로 따라 해도 요리가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리에 서툰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가족에게 해주려는 제 사랑이 책 곳곳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런 마음을 다 읽더라고요. 미국에 오니 집집마다 제 요리책이 있어서 놀랐어요. 심지어 영문판은 아마존에서 ‘한국 요리 최고의 레시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저는 주부 10년 차인데도 아직 요리가 어려워요. 요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타고난 줄 알지만 절대 아니에요. 초보 주부 시절, 언니한테 “얼마나 넣어야 해?” 물어보면 항상 적당히, 한 움큼이라고 대답해서 얼마나 답답하던지… 살캉하게 삶아라, 삼삼하게 절여라 이런 말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잘 먹는 음식은 재료 계량한 것과 조리 순서를 일일이 적어두었다가 그대로 해먹이고, 잘 안 먹는 음식은 재료, 조리법도 바꿔가며 애썼죠. 그렇게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음식이 맛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오랜 세월 쌓인 레시피 덕분이에요. 나이 들면 입맛이 무뎌져서 간 보면서 음식 만들다가는 짜지기 십상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음식 만들 때 일일이 다 계량하고 레시피를 다시 봐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어쩌다 제가 음식 만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요리연구가라는 사람이 초보 주부처럼 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림잡아 대충 넣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야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손맛이라는 것은 사실 다 거짓부렁이에요.(웃음) 무엇보다 간이 맞아야 하거든요. 계량이랑 요리순서가 정확하면 누구든지 간을 딱 맞춰서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부들과 얘기하다 보면 간이 짜니 싱겁니 하면 화가 난다고 하소연을 해요. 어떤 분은 “내 손에 따신 밥 먹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큰소리치죠. 식구들 한 끼에 소홀하면서 어떻게 내 식구가 건강하길 바라겠어요. 식구들 탓하기 전에 내 정성이 부족하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손맛이 타고나는 줄 알았는데 계량만 잘하면 초보도 전문가의 손맛을 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제가 요리도 가르치는데 여덟 명 이상은 절대 받질 않아요. 학생들이 계량스푼 잴 때 안 보는 척하면서 제가 다 봐야 하거든요.(웃음) 계량은 조금만 잘못해도 꼭 얘기해 줘요. 젓가락 같은 것으로 계량스푼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들 그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 계량스푼 위로 재료가 솟아온 게 한 티스푼은 돼요. 그런 식으로 계량하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계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요리 순서예요. 한번은 제가 남자들한테 무생채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중에 민 씨네라고 양반집 자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요리를 안 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요리 순서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민 대감 집에서 이런 걸 배우세요?” 농담해 가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만들어 놓은 다음 각자 맛을 다 보잖아요. 그제서야 그분이 “내 거 왜 이래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듣고 틀리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는 거 있죠.(웃음)

요리를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인연도 많으시지요?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남자들을 위한 족집게 요리 교실’이었어요. 나이 들고 손수 밥해 먹어야 하는 아저씨, 혼자 사는 총각들이 모였는데 다들 얼마나 재밌어하면서 배웠는지 몰라요. 배운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 먹고 나중엔 아들딸 김치도 담가주고 제사까지 지내게 됐대요. 부인들이 더 좋아해서 서로 자기 남편 요리 교실 넣겠다고 경쟁이 장난 아니었어요.(웃음)
특히 마흔 넘은 노총각이 기억에 남아요. 질문이 어찌나 많은지 요리하다 말고 “끓는 물에 몇 분 데쳐요? 찌개는 몇 분 끓여야 해요?” 남들 다 아는 것까지 꼬치꼬치 물으니 다른 아저씨들도 그분을 구박했어요.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저도 나중엔 쥐어박고 싶더라고요.
장선용 요리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