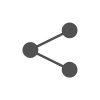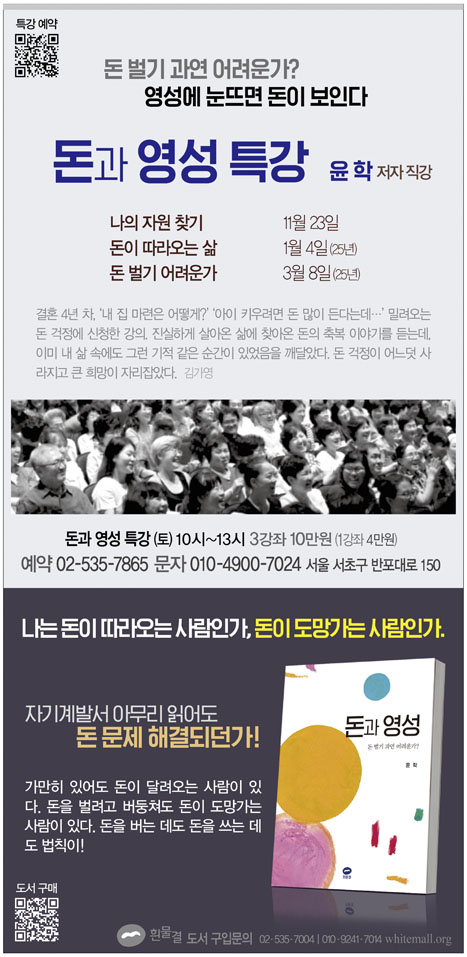100세 시대
지난 10여 년에 걸쳐 1000여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는 ‘후회’였다.
은퇴자들이 들려주었던, 고통스럽고 슬펐던 진실을 그냥 이대로 묻어둘 수 없어 연재한다.
한혜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퇴 후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나의 질문에 58세 M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를 쓰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 혹시 잘못 들었나?
50대 후반의 남자가 시 얘기를 하는 것도 특이했지만 무엇보다 스물일곱부터 30년 동안이나 은행에 근무하다가 은퇴했다는 M씨는 지금도 전형적인 ‘뱅커’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시를 쓰지 못한 것”이라는 그
의아해하는 나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M씨는 그제서야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렇다고 대학 때부터 시를 쓰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시나 소설 강독 시간에 별 재미를 못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득 차서 한가하게 시나 읽는 대학 생활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마흔이 넘으니까 저절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시 읽고 소설 읽던 대학생활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M씨는 덧붙였다. “고등학교 때 내가 쓴 시를 보고 ‘너 시인 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던 국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귀에 뱅뱅 맴돌지 뭡니까? 변명 같지만, 시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마흔 무렵이 제일 바쁜 때였어요. 애들 교육비 부담도 커졌고, 승진에도 신경 써야 했고… 그런데 내가 시를 쓰지 못한 데에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내가 시를 써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주변 반응이 엄청 부정적인 거 있죠? 특히 집사람은 내가 ‘전업 시인’이 되는 걸로 착각했는지 ‘식구들 밥 굶길 일 있냐?’며 화부터 내더군요. 또 선배 한 분은 ‘괜히 시 쓴다고 나대지 마라. 감성만 발달한 무책임한 사람으로 찍히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충고하더군요. 나부터도 밥 굶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니 시가 써졌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시를 써도 되겠죠. 시간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시간도 많고 시 쓴다고 비웃는 사람도 없는데도 시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전에는 너무 바빠서 시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시간도 많으니까 시가 잘 써져야 할 텐데요?”
M씨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참 만에 답했다. “전에 최승호 시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