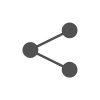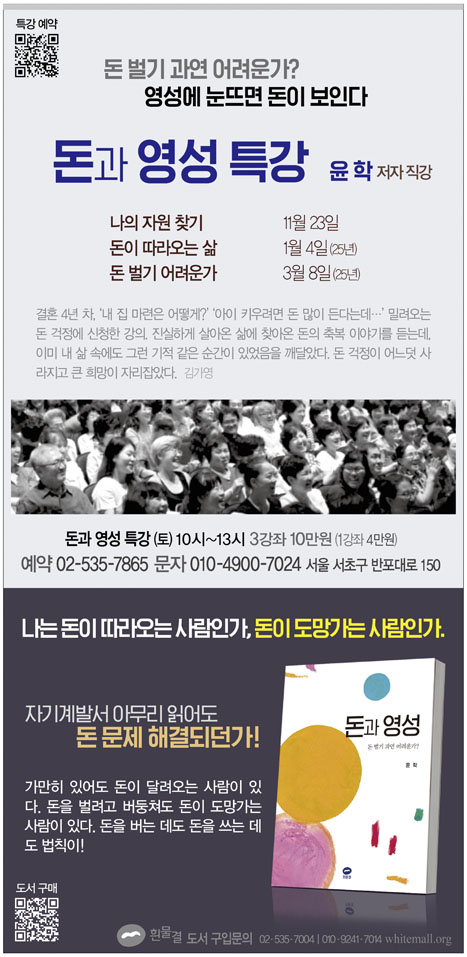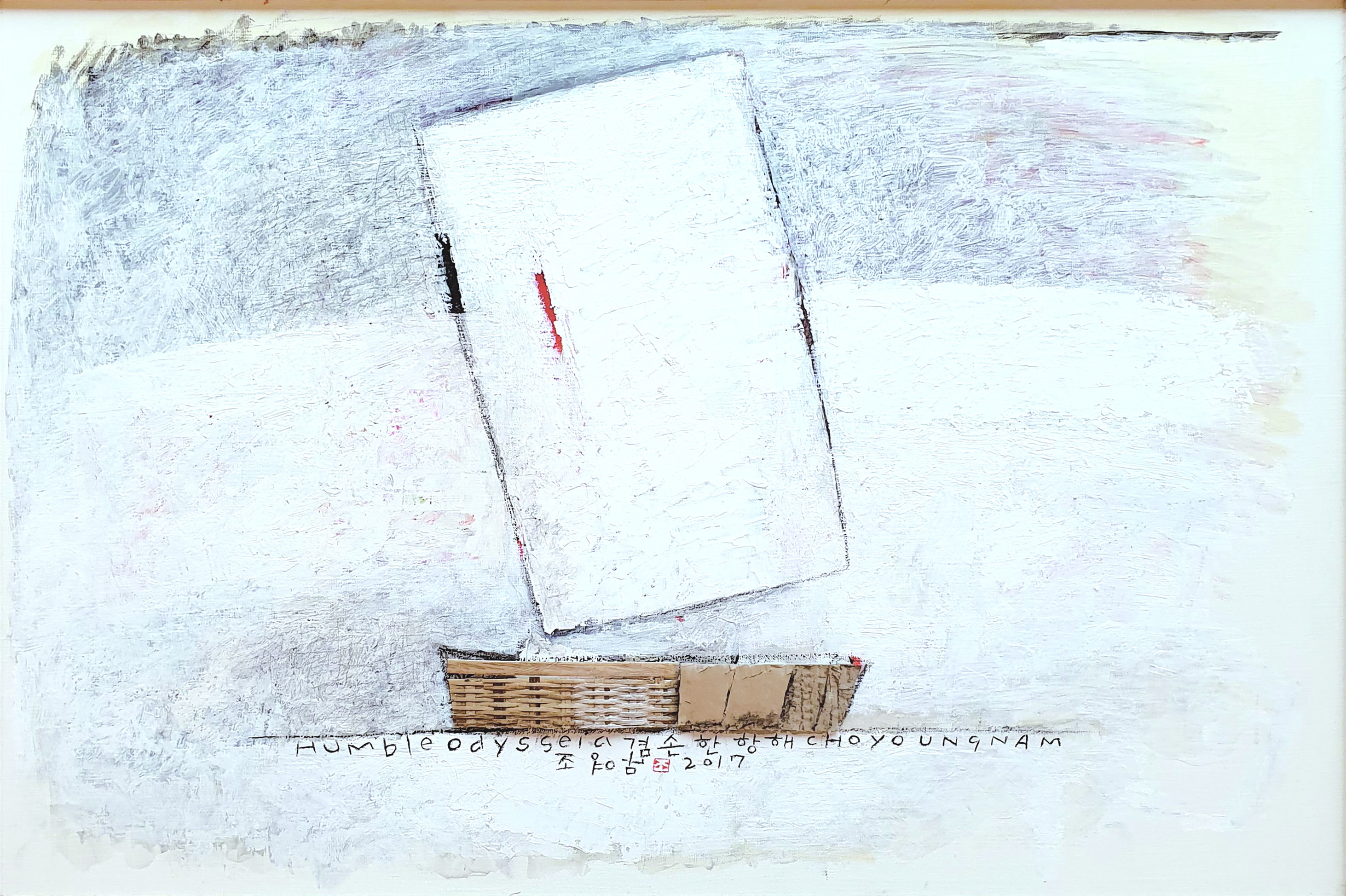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찾아와 “아니 세상에, 신문을 발행하다니! 요즘 누가 신문을 읽어?”하고 걱정했다. 언론계에 있었던 후배는 내 소식을 듣고 인터넷 신문을 만들겠지 했다며 “왜 돈 많이 드는 종이 신문을 시작했느냐” 의아해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읽었다. 섬에서 어렵게 살았어도 아버지는 신문을 구독했다. 서울에서 인쇄된 신문이 우리 집에 배달될 때는 하루 이틀 지나 있었다. 서울에서 10시간도 넘게 기차를 타고 목포로 오고 또 다섯 시간 동안 배에 실려 섬에 도착했다. 아버지와 나는 뉴스 가치도 떨어진 신문을 한약방 마루에 걸터앉아 1면부터 마지막까지 샅샅이 읽었다. 신문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었다. 나는 신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감동적인 글이나 멋진 인터뷰가 실릴 때면 아버지와 나는 서로 먼저 읽으려고 줄다리기했다.
이틀 지나 도착한 신문 뉴스 가치도 없었지만 아버지와 마루에 걸터앉아 샅샅이 읽어
광주로 고등학교를 가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먼 친척 고모 댁 문간방에서 자취했는데 고모는 아침이면 언제나 신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고모가 본 신문을 가져다 읽고 나서야 학교 공부를 했다. 고모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않았는데도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와 품위가 있는지. 한번은 학식과 인품이 남달랐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 왔다가 돌아가지도 않고 고모와 한참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다음날 선생님은 “광주 시내에 그렇게 품격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 있는 줄 몰랐다”며 무척 신이 난 표정을 지었다. 수십 년이 지나서도 선생님은 나를 만나면 그 고모의 안부를 묻곤 했다.
대학생 때 서울에서 방 한 칸 얻어 자취하면서도 신문을 구독했다. 그 집주인도, 커리어우먼인 멋쟁이 따님도 신문을 보지 않았다. 나중에는 이층집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 집주인도 집이 몇 채나 있는 부자였지만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하면서도 신문은 끊지 않았던 내 눈에는 그분들이 이상하게 보였다.
당시 한양대에 다니던 선배가 자주 놀러 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그 형은 학점이 좋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며 술도 사고 밥도 자주 사줬다. 가끔 그의 하숙집에 따라가면 그 형의 책꽂이에는 교과서 몇 권만 덜렁 꽂혀있었다. 그 어떤 책도 신문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 방도 들여다보면 모두 교과서 몇 권과 기타만 덩그렇게 놓여있었다. 신문도 구독하지 않고 책도 보지 않는 대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그 후 나는 학교 친구들 방에 가게 되면 신문을 구독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대생들의 하숙집이며 자취방도 마찬가지였다. 전철에서 산 스포츠 신문은 가끔 눈에 띄었지만 나처럼 일간신문을 구독하는 대학생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도서관 게시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만 가끔 보았을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 신문은커녕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탄. 과거에도 신문 구독 대학생 드물더라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신문은커녕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젊은이가 많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시절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유신과 박정희 독재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시대를 한탄하고 국가의 장래도 걱정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면 나는 어리둥절해지곤 했다. 신문보다 그 시대를 생생히 전해주는 것은 없지 않는가. 그 시절을 진정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면 시대의 속살을 보여주는 신문을 구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상의 속살을 보지 않으면 남이 떠드는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요즘 종이 신문은 스마트폰 뉴스에 밀려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모두들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막상 훌륭한 글을 읽어도 스쳐 지나가고 만다. 글을 읽는 것은 남의 생각을 받아들여 새롭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함인데 스마트폰 뉴스로 생각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흘려보낼 뿐이다. 높고 깊은 사고 없이 얕고 낮은 생각만 하고 살면 내 삶이 어찌 되겠는가.
나는 믿는다. 스마트폰이 온 세상을 덮는다 해도 생각을 넓히고 높이려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에 종이 신문은 꼭 필요하다.
인간은 가상의 인간과 결혼 못 하듯 기계적 사고와 흘러가는 스마트폰 정보만으로 만족 못해
30년 전 월간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언론학 교수를 하는 친구가 찾아왔다. “인터넷 시대에 웬 월간지냐? 뉴욕타임스도 타임지도 망해간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때도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에 매달려도 종이책을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당시 월간지 구독자가 500명이었는데 지금 10여만 명 가까이로 늘었다. 이것이 현실이고 진실 아닐까.
IT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과 결혼할 수 없듯, 인간은 기계적 사고와 흘러가는 정보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인간과 결혼해야 삶다운 삶이 다가오듯 우리는 오늘을 진실하게 담아낸 종이 신문을 읽어야 동시대 사람들을 깊고 폭넓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소리에 갇혀 생을 마감할 뿐이다.
그런데 요즘 종이 신문까지도 점차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 한쪽 편만 드는 선동으로, 비즈니스에 물든 상혼으로 인터넷 기사를 점점 더 닮아간다. 그 좋은 글솜씨로 사람을 위한 기사는 쓰지 않으니 신문이 제 기능을 못하는 오늘이다.
보물은 보물함에 담겨야 한다. 보물이 쓰레기통에 담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깊게 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지구상에 없다. 스마트폰의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재하는 종이 위의 보물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집집마다 신문다운 신문을 읽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발행인 윤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