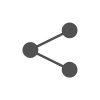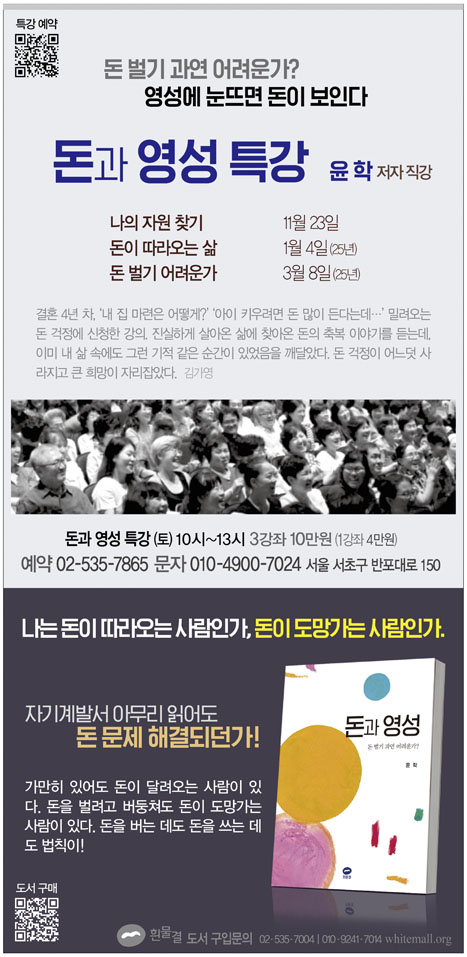오래전 일이다. 거래처에서 급하게 물건을 쓸 일이 있다기에 일요일에 출근했다. 점포 앞 대로변에서 거래처 사람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날은 우리 가게만 문을 열고 있어서 길을 묻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중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여인은 보따리 하나는 머리에 이고 또 하나는 손에 들고, 남은 한 손으로 등에 업은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고 있었다. 셋 중 어느 하나도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었다.
“실례지만 좀 묻겄시유. 대림예식장이 워디 있어유?” 대림예식장은 영등포동에 있는 그 예식장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얼른 손에 든 보따리부터 빼앗듯이 받아 들고 여인을 버스정류장까지 안내했다. 예식장에 가는데 짐보따리를 꾸리고 나선 모습이 애처롭게 보였다.
“예식장에 가시는데 웬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볍지도 않은데요” “있는 거니께 가져왔시유. 따로 또 못 오잖여유. 이 사람 저 사람 여럿 만날 거구만유” 예식장에서 만날 친지들에게 나눠주려고 집에서 가꾼 곡식 따위를 힘겹게 싸 들고 온 것이 분명했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며 영등포동으로 가는 버스에 여인을 태워 보냈다. “일곱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일곱 번째!” 여인은 보따리 무게에 숙여지지 않는 고개를 몇 번이고 주억거렸다. 그새 등에 업힌 아기도 깨어 웃고 있었다.
머리와 손에 보따리 하나씩 남은 한 손으로 아이 엉덩이 받치고 “대림예식장이 워디 있어유?”
그 예식장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일곱 번째 정류장 내리세요!” 그런데 나중 보니 ‘신대림예식장’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는 평생 모르고 지나치기도 한다. 나도 그날 ‘우연히’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여인에게 길을 가르쳐준 일을 평생 아름다운 미담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칠 뻔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딱 그 예식장 간판과 마주쳤다. 그런데, ‘대림예식장’이 아니라 ‘신대림예식장’이 아닌가! 그새 간판을 바꾸어 달았나 싶어 유심히 살펴도 그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이었다. 그렇담 대림예식장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림예식장은 우리 가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아 코앞에 두고도 몰랐던 것이다.
순간 눈앞에 힘겨워하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식장은 잘 찾아갔을까. 늦게라도 친지들을 만나 짐 보따리는 풀었을까. 아이와 무거운 보따리 둘을 업고 들고 힘들어하던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자 얼굴이 마구 달아올랐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어디 사는지를 알면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때 일은 두고두고 나를 부끄럽게 했다.
이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