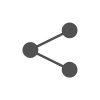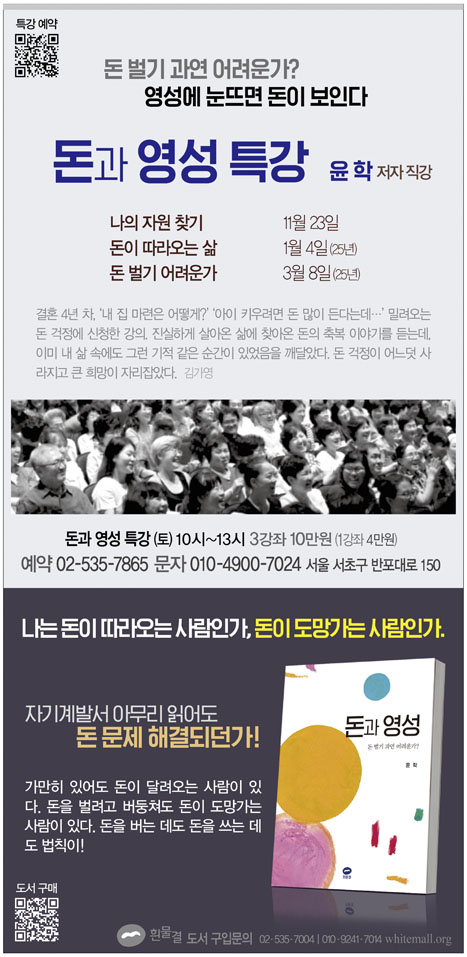홍신자 무용가
내가 무용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용가가 되었고, 마치 배가 고파 밥을 먹듯 그렇게 춤을 추며 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무용을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까지 현대 무용을 제대로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특별히 전공하고 싶은 것이 없었던 나는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때 미국은 나에게 꿈이자 자유였다. 거기에선 무엇이든 해볼 수 있고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대부분 다분히 세속적인 것들이긴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컷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틀 전에야 내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막 떠나려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저마다 못마땅하다는 듯 한마디씩 던졌다.

“그런 데 간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을 못 봤다” “시집이나 가지, 과년한 처녀가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니?”
나는 외로웠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가족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개중에는 이런 말로 마음을 돌이켜 보려는 사람까지 있었다.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나 해?” 아닌 게 아니라 비행기가 폭발할까 봐 걱정하던 시절이었다.
일본에서 하루를 경유한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서 또다시 환승해야 했다.
내가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먼저 유학을 와 있던 친구가 숙소로 찾아왔다. 그리고 미국 생활의 여러 가지를 마치 관공서 직원처럼 사무적인 투로 일러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는 내 생활이 있어. 아주 바쁜. 내가 엄마처럼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고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사라져 버렸다. 어차피 모든 일은 혼자서 해내야 하는 것이므로. 뉴욕에서의 삶은 한동안 야속하고, 외롭고, 두려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나는 알윈 니콜라이의 무용 학교에서 처음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알윈 니콜라이는 무용으로 나를 감동시킨 최초의 사람이다. 이제 막 무용을 시작한 어느 날, 그의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하지만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나도 그 장면에서 눈물 흘렸는데!” 무언의 몸짓만으로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다니
무용이 시각에만 호소하는 예술이 아님을 깨달아 내가 감동을 주는 춤을 출 수만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