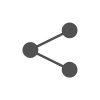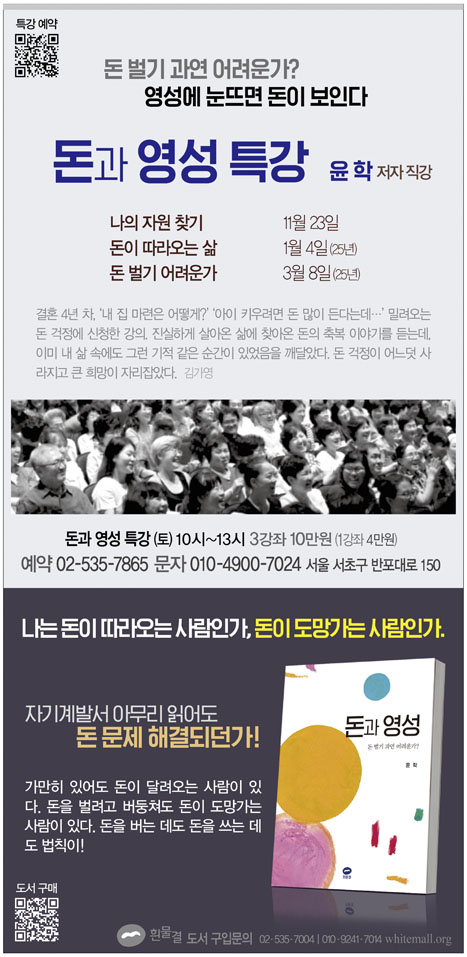최옥식 前 영남대 교수
사흘을 굶었다. 대학 신입생 때 사흘을 굶은 적이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주머니가 텅 빈 것이다. 누구 하나 기댈 데가 없어 앞일이 막막했다. 공부는 밀렸는데 이렇게 메말라서야… 3일 전 저녁부터 아홉 끼를 굶었지만 매일 학교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숙제를 했다. 그러면서도 기숙사 친구들이 눈치챌세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버티었다. 그러나 사흘째에는 다리가 후들후들했다. ‘오늘 저녁도 굶어?’ 하다가 눈이 핑 돌았다.
문을 나서는데, 마침 같은 기숙사에 있는 오스트리아 친구 요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다짜고짜 물었다. “어이, 돈 좀 있어?” “얼마나?” “한 3백 실링” 그는 아무렇지 않게 3백 실링을 건네고는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그가 나를 찾아왔다. 자기는 대학 내의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괜찮다면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밥줄이 끊어진 판에 내가 무슨 일을 못 할까.
사흘을 굶었다. 오스트리아 친구에게 다짜고짜 “돈 좀 있어?” 그가 3백 실링 건네고서 주급날 돈 갚자 “나, 네게 돈 빌려 준 일 없어”
그다음 날부터 방과 후가 되면 그와 나는 인쇄소에서 책장을 간추리며 강의록 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드디어 주급날이 왔다. 경리과에서 돈을 타기가 바쁘게 나는 그에게 돈을 갚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하려 했는데 예기치 않은 그의 대답이 내 귓전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