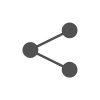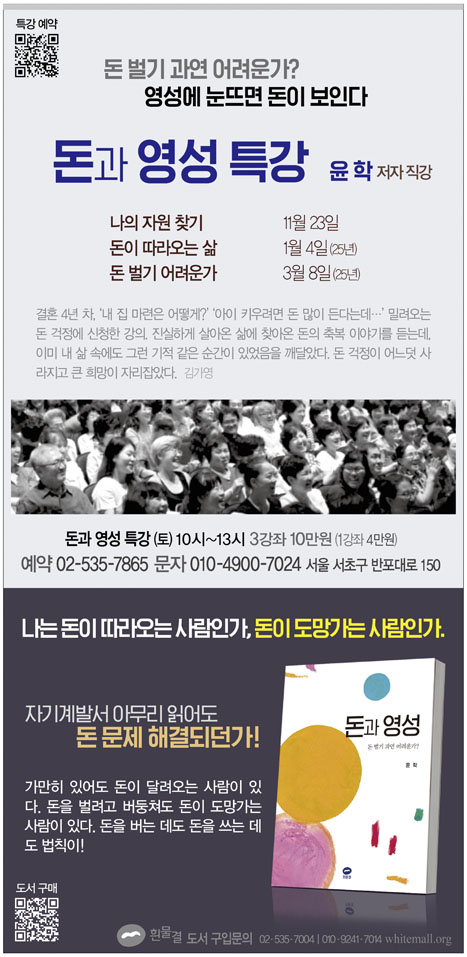철도공무원에서 외교관으로
김완중 前 호주대사

시골에는 전기도 들어오기 전이라 우리 집은 초저녁에도 칠흑같이 깜깜해졌다.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지그시 눈을 감고 철도공무원 정복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밤낮없이 농사일 하는 부모님께 매달 월급도 드리고, 장가도 가 있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카투사로 군복무 하면서 내 꿈은 외교관으로 바뀌었다. 명색은 한미 연합 훈련이었지만 훈련은 늘 미군 주도로 이루어졌다. 같은 계급이라도 미군과 카투사 간 역할 차이는 컸다. 국제법상으로는 평등하다지만 강한 외교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치를 찾는 데 일조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싹튼 것이다.
카투사 복무 중 철도공무원에서 외교관으로 꿈 바뀌어 우리나라 위치 찾는데 일조하고 싶어
군 제대 후 외교관 면접시험에서 질문을 받았다. ‘부자는 모두 도둑놈이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학생 때는 이분법적 생각이 특히 강한데도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면 응당 존경받아야 한다’는 답을 하여 외교관이 되었다. 이때만 해도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했다. 실제 외교관이 되자 고민이 많았다. 외교관은 해외공관 발령장을 받으면 온 가족이 임지로 떠나야 했다. 인사 발령에 매번 신경을 쓰게 되고, 간부들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공관에 발령받기가 쉽지 않았다. 아쉬운 이야기를 잘 못하는 나는 나이는 어려도 잘나가는 동료들을 보며 내가 과장이나 되어보고 은퇴는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해외공관 근무를 나가면서부터 나는 외교관의 진수를 맛보기 시작했다…